
권영규 / 수필가, 시드니한인작가회 회장
문화유산 계승의 힘
공자 왈, ‘70세에는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라고 했다. 그래서 나이 70을 일명 종심(從心)의 나이라고도 한다. 내가 이 나이에 퍼펫쇼(puppet show)를 하겠다고 용기를 내어 그것도 이태리에서 대중 앞에 첫 데뷔? 를 했으니 나의 그 당돌한 용기는 공자의 설파와도 무관치 않다고 본다. 실은 한 가지가 더 있긴 하다. 십여 년 전, 칠십이 다된 나이에 석사모를 쓴 호주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나이와 무관하게 대학원에 진학하여 역사를 공부하고 훨훨 크루즈 여행을 떠났던 것이다. 아마도 가슴에 묻어두었던 버킷리스트에서 드디어 그 항목 하나를 지우지 않았을까 싶다. 나는 그런 리스트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새삼스럽게 그녀를 떠올리며 용기를 내었다. 나도 뒤늦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보니 마음속에 새싹이 움트는 듯 회춘을 느낀다.
중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태리의 소도시에서 올 여름에 열린 퍼펫 페스티발에 초대되어 딸과 함께 다녀왔다. 초등학교 선생이자 퍼펫 경력 십오 년의 딸에게 배워서 우리 모녀가 함께 참가하게 된 공연 제목은 ‘해녀, 바다의 여인들’이었다. 소도구로는 소라, 전복, 거북이, 문어 등 대부분의 퍼펫을 털실로 크로셰짜기하여 만들었다. 이야기는 동화처럼 펼쳐진다. 할머니가 건네주는 태왁망사리(제주도 사투리. 물에 뜨게 하는 부표와 채취물들을 담는 그물망태)를 거부하던 어린 손녀가 어느 날 플라스틱이 목에 걸린 거북이를 발견하게 된다. 플라스틱을 떼어주고 거북을 따라서 용궁에 다녀온 할머니가 흰 조개를 받아오는데... 마침내 손녀는 할머니와 함께 물에 들어가게 된다. 피날레에서는 공연 전에 미리 정한 관중 속의 어린이들이 앞에 나와서 바다를 연상케 하는 파란 실크 천을 양쪽에서 흔들고 그 위를 해녀와 손녀, 물고기와 문어 퍼펫이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다.
그 옛날 수도원이었던 장소에서 여덟 번 공연을 했다.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에게 사라져가는 한국의 해녀문화를 소개하고 계승하려는 노력이 나름대로 잘 전해졌다고 생각한다. 공연시작 전에 제주해녀에 대하여 이태리어로 번역한 것을 딸이 간단히 소개 했다. 그리고 해녀노래, 대금 등 음악을 배경으로 대화 없이 비주얼 효과를 노렸다. 대사는 없어도 간단한 한국어와 이태리어로 ‘아이고’, ‘이리 온~ 비에니’ 등 몇 마디만 던질 정도였다. 공연이 끝나고 우리가 모녀라고 소개되었을 때 관중들의 박수소리가 소나기 쏟아지듯 들렸다. 우리는 마치 한국 전통문화 홍보대사라도 되는 양 큰 보람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공연을 한 그 고장도 예로부터 어머니가 딸에게 전수하여 이어지고 있는 ‘보빈레이스’ 짜기로 유명하기에 우리의 공연은 더 가까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 고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물 흐르듯 전수되어오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 돌로 높이 쌓아 올린 성벽을 배경으로 세 사람이 앉아서 무언가 하고 있는 동상이 눈에 뜨였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할머니, 딸, 손녀 3대가 앉아서 각자 받침대에 베개처럼 생긴 것을 얹고 그 위에 방망이를 축소한 모양의 작은 실패(보빈)가 여러 개 매달려 있는 기구 앞에서 보빈레이스 짜기를 하는 모습이었다. 바늘대신 실패를 이용하는 이 레이스짜기는 올리브, 와인과 함께 이 고장의 3대 대표적인 유산으로 손꼽힌다. 안경을 코에 걸친 큰 몸집의 할머니와 엄마 옆에서 레이스 짜기를 하는 어린 손녀가 조각되어 있는 매우 인상적인 동상이었다. 옛날에는 흔하디흔한 모습이었겠지만 전수를 외면해버린 현대인으로서는 조각으로 남긴 동상을 보는 현실이 되고 말았으니, 나는 해녀의 물질 역시 그 맥이 끊길 단계라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한참을 그 앞에 서있었다.
우리가 2주 동안 머문 숙소는 성벽 안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었는데 매일 보빈레이스 가게가 있는 골목길을 지나게 되었다. 가게 위층은 살림집인 듯 환갑이 넘어 보이는 여주인 피나씨가 매일 가게 앞에 나와 앉아 딸그락거리며 레이스를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창백한 얼굴에 깔끔하고 고상한 차림새의 그녀와 나는 말은 통하지 않지만 서로 ‘안녕하세요’ 정도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지인이 귀띔으로, 피나씨의 외동아들이 젊은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나름대로 이런 상상을 했다. 그녀가 꿈꾸었을 아들의 결혼식, 넥타이를 맨 어린아이가 반지를 올려놓은 피나씨의 수제품 레이스쿠션을 양손에 받쳐 들고 음악에 맞추어 걸어 들어오는 모습. 식탁보도 짜주고 손녀가 탄생하면 이 기술을 전수하리라 마음먹었을 터이지만 그 꿈이 유리 깨지듯 산산조각이 났으니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슬플까. 딸이 있었다 해도 레이스 짜기를 선뜻 배우고 싶어 했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 해녀의 딸들과 이태리 소도시 Offida의 딸들이 언제까지 그들의 어머니의 길을 가게 될 것인지. 문명의 발달로 그 많은 수제품과 생활방식은 아날로그 시대의 흔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종심의 나는 뒤지지 않기 위해서 숨 가쁘게 곡예 하듯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권영규 / 수필가, 시드니한인작가회 회장













![[홍콩] 홍콩의 스케이트 공원 - A Guide to skateparks in Hong Kong](http://okja.org/files/thumbnails/365/142/200x145.crop.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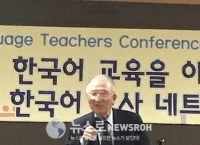



![[구석구석 홍콩여행] 신비의 섬- 텅 핑 쟈우(東 平洲)](http://okja.org/files/thumbnails/981/141/200x145.cro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