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칼럼] 다시 돌아보는 언론인의 기본 자세

리영희 교수
리영희는 통신사 외신부 기자, 모 신문 월남전 종군기자, 편집위원, 편집국장을 거치는 동안 이른바 '시대를 보는 눈'을 갖게 되었는데, 모 대학 언론학 교수가 된 뒤로 내부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에 괴로워 하다가 몇권의 책을 내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우상과 이성>, <전환시대의 논리>, <8억인과의 대화> 등이었다. 그의 책들은 양반들 춘향전 돌려읽듯 이 사람 저 사람 건네지게 되어 일약 지하 베스트 셀러가 되고 말았다.
그의 글들은 당시 정부 발표문이나 충실하게 받아쓰고 있던 신문들의 행간을 읽으면서 장님 코끼리 만지듯 시대를 더듬고 있던 지성인들의 양심에 망치질을 가하는 충격을 주었다.
사실 리 교수의 당시 글들은 한껏 기교를 부렸다거나 이리 저리 주석을 달아가면서 쓴 논술 형태가 아니었다. 그는 신문사 밥을 먹고 있거나 먹을 후학들에게 '미문(美文, 迷文)'을 쓰려 하지 말 것을 강조했고, 스스로도 이를 실천하려 애썼다. 어디서 구했는지 실증적 자료를 동원한 그의 글쓰기는 얼핏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요!" 류의 단순한 외침에 불과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글들은 묘하게도 읽는 사람의 의식 깊은 곳을 헤집는 마력이 있어서 '아, 속아 살았구나'라는 공통의 회한을 남겼다. 90년대 이후 운동권 학생들이 읽는다면 하품 나오게 할 글들이 당시에는 운동권 학생 뿐 아니라 일반 식자층의 필독서가 되어 버렸다. 결국, 리 교수는 정보기관에 의해 '의식화의 원흉'으로 찍혔고, '빨간물'을 뒤집어 쓰고 수차례 감방을 들락거려야 했다.
'언론인' vs '언롱인'
일반적으로 비판·폭로기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신문의 감시·고발·비판 기능을 신문의 부차적 기능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 사회의 어둡고 왜곡된 부분은 '적게, 조용히' 취급하기를 원하고 밝고 아름다운 면을 크게 부각시키기를 원한다. 그들은 신문의 감시·고발·비판 기능이 우리사회를 혼란스럽고 불화·불신·반목하게 만들어 종국에는 파멸시킬 것이라 믿는다.
모두가 알다시피 인류 역사상 사실에 입각한 비판·고발 기사를 다룬 언론 때문에 한 사회나 국가가 파멸에 이른 적은 없었다. 쇠가죽처럼 끈질기고 당찬 두 기자의 폭로로 시작된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한 언론이나, 1960~70년대 반전운동을 가감없이 보도했던 언론 때문에 미국 사회는 무너지지도 난장판이 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더욱 건강한 사회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한국 언론계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정보' 만능의 시대에 편승하여 '속기사' 또는 '인간 복사기'에 다름없는 자칭 언론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변절을 밥먹듯 하던 일제시절의 자칭 민족지들, 그리고 군사정권 시절의 어용 언론들 속에서 대기업체 사원같은 월급쟁이 기자들을 우리는 수도없이 보아왔다. 이 시대에 주는 대로 받아쓰거나 '빨아주는 기사'를 업으로 하는 기자는 공산주의 사회의 '보도일꾼' 밖에는 없다. 일찌기 리 교수는 비판의식이 없는 기자들을 '언롱인(言弄人)'이라 지칭하며 '감히 언론인을 참칭하는 무리'라고 질타했다.
그룹 커뮤니케이션(group communication)이론서에 집단사고(集團思考, groupthink)의 폐단에 대한 실례들이 등장한다. 그 책은 '문제 있음'을 사전에 감지한 극소수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집단의 집단사고에 파묻혀 재난을 당한 실례들로 일본의 진주만 공격, 첼린저 우주선 폭발사고, 한국전쟁 등을 소개한다.
사실 전문가 집단에서 대다수가 '문제없다, 잘 돼간다'라고 만장일치에 가까운 동의를 할 때 "아니다, 문제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 나아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분명한 부도덕, 탈법 범법행위가 다수 대중의 도덕성을 타락시키거나 우리 사회의 공의의 질서를 깨고 있을 때 읍참마속의 자세로 '아니오!'라고 말한다는 것은 별다른 담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언론인의 영원한 존재론적 담론, '문제의식'
그는 집단적 자기도취에 빠져 황홀경을 헤매고 있는 종교집단 속에 들어가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며 시비를 걸 수 있는 신학교 졸업반 학생 같은 사람이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말할 때 돌다리를 두들겨야 하는 사람이 언론인이다.
언론인은 누구인가? 그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교묘한 술수로 자기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내몰아 죽게한 후 그의 아름다운 아내를 탈취한 다윗왕 앞에서 '불가!'를 단호하게 외쳐댄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언론인이다.
언론인은 그럴듯한 궤설과 위엄으로 양떼같은 대중에게 면죄부 구매를 요구하던 교부들에게 항변한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이다. 서릿발같던 독재정권의 전횡과 유신 교설에 빠져 있던 독재자를 향해 '속임수요!'라고 말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언론인이다.
한마디로 언론인은 기본적으로 문제 없어 보이는 환경의 뒷막을 들춰내고 문제를 찾아서 뒤적거리는 자요, 문제 있는 환경의 내막을 정직하게 고발·비판해서 집단 파멸을 방지코자 하는 '환경 감시자'요 파숫군이다.
가치중립의 신자유주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다 하더라도, 언론이 존재하는 한 가치판단을 기반으로 한 '문제의식'은 언론인의 영원한 존재론적 담론이어야 한다. 대체 우리는 언론인인가, 언롱인인가.
 사무총장
2015.11.09. 18:44
사무총장
2015.11.09. 18: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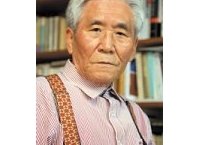






![[파미르 여행기 7] 구름이 유르타 지붕에 앉아 쉬어가는 곳, 야크들의 낙원](http://okja.org/files/thumbnails/356/002/200x145.crop.jpg)
![[파미르 여행기 6] 동 파미르의 중심 무르갑, 여행자들과 만남이 있는 도시](http://okja.org/files/thumbnails/354/002/200x145.crop.jpg)
![[파미르 여행기 5] 평균 해발 3000미터 이상인 파미르 고원에도 어부가 있다?](http://okja.org/files/thumbnails/351/002/200x145.crop.jpg)


![[파미르 여행기 - 4 : 평균 해발 3000미터 이상인 파미르 고원에도 어부가 있다?]](http://okja.org/files/thumbnails/346/002/200x145.cro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