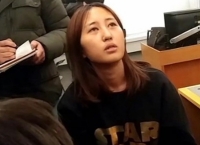[i뉴스넷] 최윤주 편집국장 editor@inewsnet.net
1960년대 한국에서는 대학을 가리켜 ‘우골탑’이라고 불렀다. 가난한 농가에서 소를 팔아 자식에게 대학교육을 시킨데서 유래한 말이다.
신성한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여 ‘상아탑’이라는 귀한 이름을 붙이던 대학교육이 농가의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소의 뼈로 쌓아올려졌다는 뼈아픈 비유가 담겨 있다.
소가 인간의 생존과 밀접하게 관계된 동물이었다면, 말은 국가와 가족을 지키는 방패였다.
운송수단이나 군사용, 때로는 농경을 위해 쓰였던 말은 옛부터 사람들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 생활해왔다.기마 민족었던 한민족은 유난히 말을 사랑해 말과 관련된 유물 또한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전쟁이 빈번했던 고대사회에서 말은 전투력의 상징이었고, 기마부대의 전투력에 따라 전쟁의 승패와 국운이 좌우될 정도로 중요한 존재였다.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여섯가지 가축, 즉 소·말·양·돼지·개·닭 중에 우리 선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축이 소와 말이다.
인간들의 삶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 소와 말은 늘 함께 열렸던 우시장과 마시장처럼 사람들의 인식 속에 마치 짝꿍처럼 취급돼 하나의 범주 안에 놓이곤 했다.
사자성어에도 함께 등장한다. 뿔이 없는 송아지와 뿔이 있는 말이라는 뜻의 동우각마(童牛角馬)는 도리에 어긋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흙으로 만든 소와 나무로 만든 말이라는 뜻의 토우목마(土牛木馬)는 겉만 번지르르하면서 실상은 하나도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동물의 성질은 전혀 다르다. 무엇보다 소는 느리고 말은 빠르다. 느린 걸음을 뜻하는 ‘우보’는 소의 걸음을 말하고, 빠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천리마’는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을 의미한다.
소와 말이 지닌 성질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건 홍수가 났을 때다. 원래 소와 말은 모두 헤엄을 잘 친다. 특히 말은 소보다 힘이 세 헤엄 속도가 훨씬 빠르다. 대략 소보다 두배 정도.
그러나 홍수가 나 물살의 속도가 빨라지면 얘기는 달라진다.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땅을 달리는 습성대로 말은 자신을 떠미는 강한 물살에 저항하며 다리를 버둥댄다. 그러나 급물살을 이기기는 역부족,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다 결국 힘이 빠져 익사해버리고 만다.
반면 느리고 소극적인 소는 자신의 습성대로 물에 저항하지 않는다. 빠른 물살에 어쩌지도 못하고 떠내려가는 소를 보며 저러다 죽겠다 싶지만 한참을 떠내려가다가 얕은 뭍에 만나면 목숨을 부지하기도 한다.
“큰 물이 나면 헤엄을 훨씬 잘 치는 말은 급류를 거슬러 오르려다 힘이 빠져 죽고, 헤엄이 둔한 소는 물살에 몸을 맡겨 내려오다 강가로 나와 목숨을 건진다.”
유명한 우생마사(牛生馬死) 이야기다.
삶도 마찬가지다. 세상을 살다보면 초원을 신나게 달리는 말처럼 시원하게 달려갈 때도 있지만 급류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가듯 그 어느 하나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역경을 만나기도 한다.
우보천리(牛步千里)라고, 말보다 수십배 느린 소의 걸음이라도 뚜벅뚜벅 한걸음씩 걷다보면 천리를 가게 되는 게 인간사다.
물론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해야 할 때도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보천리만 믿다가는 시대에 뒤처지기 십상이다. 빠르게 달려야 할 때는 말처럼 달려야 하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소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말을 끌어야 잘 가고 소는 몰아야 잘 간다. 이치와 사리에 맞게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선조들의 우화와 비유가 혀를 내두를만치 절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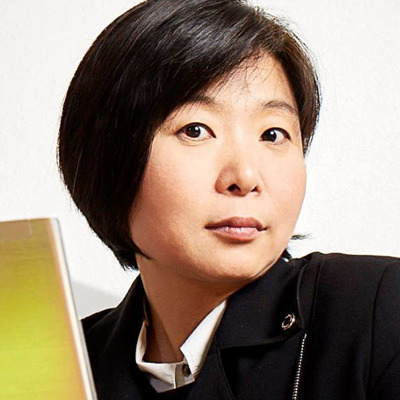








![[뒷북칼럼]‘홍콩한국국제학교’ 각종 횡령과 비리…누가 그래쓰까?](http://okja.org/files/thumbnails/450/047/200x145.crop.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