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작가의 그림 작품 (Supplied)
나의 퇴근길은 일터가 있는 시내 타운홀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QVB를 관통하게 되는데 오가는 사람들, 관광객, 쇼핑하는 이들로 늘 복잡한 곳이다. 특히 목요일이나 금요일 오후부터는 멋진 곳에서의 만남과 저녁 식사를 위해 더욱 분주해지는 길목, 밀라노의 패션 1번가 몬테 나폴레오네 거리가 떠오르며 나도 모르게 엉뚱한 두뇌 장난질이 펼쳐진다.
이곳은 화려한 패션쇼장이다. 여기 걸어가는 남녀노소는 모두 모델들, 나는 그들의 옷매무새를 곁눈질하며 점수를 매기는 장외의 심사관이다. 하루 일을 마치고도 피곤한 기색 없는 말쑥한 모습의 신사숙녀들, 느긋하게 걸어가는 멋쟁이 노부부의 색깔을 맞춘 간편복 차림새, 왁자지껄 떠들면서 아이스크림을 핥으며 역을 향하는 여학생 무리…. 졸업 후 첫 직장에서 맞은 생일축하 선물인 듯, 꽃다발을 여러 개 안은 홍조 가득한 앳된 아가씨도 보인다. 모든 모델들에게 찬사와 박수, 후한 점수를 준다. 마지막 워킹라인에 깜짝 등장한 나, 나 자신에게는 몇 점을 줄까? 실없는 웃음을 날리며 타운홀 역으로 진입한다.
갑자기 경쾌한 멜로디가 들린다. 붐비는 역 출입구 한편에 자리한 세 뮤지션의 현악 삼중주가 울려 퍼진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의 흥겹고 반짝이는 선율이 퍼져나간다. 생기발랄함이 모짜르트 곡이다. 음악학교 학생 연주가들의 청순한 감각이 묻어나온다. 내 마음도 덩달아 노래 부른다.
현의 흐름이 떠다니고 있다,
소음의 강물 위로.
우린 모두 공유하고 있다,
소리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분주함을.
그 미묘한 조화로움을….
‘고마워, 젊은 음악도들이여.’ 일과 후 무거워진 발길을 가볍게 이끌며, 예쁜 내일을 꿈꾸게 하는 그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기차는 타운홀을 지나 센트럴역 16번 플랫폼으로 들어간다. 2년 전, ‘출근길 기행’을 쓸 때와는 달리 에핑과 체스우드역 사이의 지하철 시스템이 바뀌어, 두 차례나 갈아타야 하기에, 나는 여기서 출발하는 스트라스필드 경유 혼스비로 가는 T9 선을 즐겨 이용한다. 사람들은 출근길과 마찬가지로 퇴근 때에도 바쁘다. 스무 여개의 플랫폼 중에서 자신이 탈 기차를 놓칠까 봐 뛰다시피 하는 이들이 여럿이다. 에스컬레이터 위에서도 계단을 오르내려야 직성이 풀리나 보다. 나도 그들과 휩쓸려서 환승하는 플랫폼으로 재빠르게 나아간다. 불과 여덟시간 전쯤에는 모두들 아침인사를 나누었을 텐데 지금은 헤어지는 몸짓으로 분주하다. 문득 회사에서 만난 피에르씨가 생각난다. 핸디맨으로 회사에 가끔 들리는 이 아저씨는 언제나 싱글벙글 형인데 오늘은 그냥 잠깐 미소만 지었다. 그의 아내가 아프다는 소문을 들어서인지, 무거운 연장가방을 멘 어깨에 슬픈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 사람도 저렇게 서둘러 집을 향하고 있을까? 아내의 해쓱해진 얼굴을 위로하러 뛰어가고 있을까?
내가 탄 기차도 빠르게 내달아 원주민들이 많이 산다는 레드펀을 뒤로 하고, 여러 개의 역을 휙휙 지나친다. 나는 애써 루이샴 역 가까이 있는 St.Thomas 성당을 눈에서 놓칠 세라 차창 밖을 응시한다. 오래전 이민을 와서 딸애가 다녔던 영어 집중교육학교가 성당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초등교육을 마치고 훌쩍 나라를 바꿔 새로운 언어로 공부를 해야 했던 어린 딸이, 혼자서 기차를 갈아타며 오갔던 곳이다.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대견스러우면서도 아련한 마음이 피어오른다. 벌써 세 아이의 엄마가 되어 서울에 살고 있는 딸, 역시 자랑스러우면서도 애틋한 정이 남태평양 울새의 깃털처럼 가슴을 물들인다.
인간의 시간이 이렇게도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기차도 버우드를 지나 교통이 사통팔달한 스트라스필드에 닿는다. 식당, 카페, 미용실 등 한국인 가게들이 즐비하게 있는 곳, 역전 광장에서는 언제든지 귀에 번쩍 뜨이는 한국말을 들을 수 있다. 기차는 파라마타 강기슭의 로즈에서 많은 사람을 내리게 하고 강을 건넌다. 파라마타 강은 백인이 정착하기 전, 원주민의 언어로는 ‘장어들의 물머리’라는 뜻으로 풍요의 강을 의미했다고 한다. 영국 이민자들은 강가에 공장을 많이 지어 또 다른 번영을 누렸을 테지만, 현재는 모두 이전하고 쇼핑센터를 중심으로 고층 아파트촌이 되었다. 서울의 한강이나 시드니의 파라마타 강이, 이젠 거기서 거기라는 느낌이다.
처음 이주해서 살았던 이스트우드를 지난다. 이 때 쯤이면 독서를 위해 펼쳐 놓은 책 위로, 두 눈의 빛이 사라지며 스르르 감긴다. 잠에 빠지면 내려야 할 곳을 영락없이 지나친다. 후다닥 뛰어 내린 몇 번의 경험과 다음 역에서 되돌아 왔던 속쓰림이 있었기에 에핑이라는 안내방송에, 감긴 눈을 활짝 뜨며 눈알을 굴려본다. 10분 후면 도착이다. 종착역을 앞두고 잠이 든 나를 몇 번이나 깨워준, 이름도 모르는 퇴근길의 동반자가 건너편 자리에서 나를 보며 씨익 웃는다.
나의 퇴근길은 우리 집이 있는 손리(Thornleigh)역에서 역원의 쾌활한 호루라기 소리를 뒤로하며 마무리한다. 평화롭고 한적한 내 둥지로 돌아왔다. 골든 코인을 건지는 빌딩 숲의 도시새가 되었다가, 푸른 숲의 자유로운 시골새가 되는 순간이다. 아, 잘 살았구나! 뒤뜰 검트리의 물총새처럼 오늘도, 오늘에 어우러지는 나의 귀거래사를 목청껏 노래한다.
김인숙 / 수필가, 시드니한인작가회 회원













![[홍콩] 홍콩의 스케이트 공원 - A Guide to skateparks in Hong Kong](http://okja.org/files/thumbnails/365/142/200x145.crop.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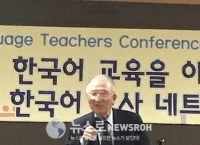



![[구석구석 홍콩여행] 신비의 섬- 텅 핑 쟈우(東 平洲)](http://okja.org/files/thumbnails/981/141/200x145.cro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