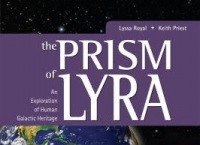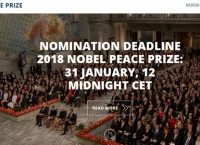Newsroh=로빈 칼럼니스트
'뉴스로' 칼럼 문패에도 소개글이 있지만 난 초등학교때 축구선수가 꿈이었다. 그 시절 나의 영웅은 ‘풍운아’ 이회택(李會澤)이었다. 당대 최고의 스타 이회택이 축구황제 펠레가 이끄는 브라질 산토스 클럽과 경기를 하던 날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1972년 6월 2일 동대문운동장에서 한국축구대표팀과 산토스클럽과 친선경기를 했다. 당시 대표팀은 부동의 스트라이커 이회택, 만19세 최연소로 대표팀에 발탁된 신예 차범근과 박이천 박수덕이 전방에, 미드필더에 이차만, 고재욱, 수비에 김호, 김호곤, 박영태, 김경중, 골키퍼 이세연으로 라인업을 이룬 아시아 최강의 멤버였다.
하지만 상대는 ‘축구의 전설’, 펠레가 이끄는 브라질의 명문클럽 산토스 아닌가. 지금은 대한민국이 월드컵도 9회 연속 나가고 세계적인 팀들과 경기할 기회가 많지만 당시만 해도 유럽과 남미 대표팀은 물론이고 명문 클럽팀들과 대결하는 기회는 거의 없을 때였다.
한마디로 ‘우물안 개구리’였다. 이날 TV 앞에서 난 한껏 흥분했다. 롤모델인 이회택이 축구황제 펠레 앞에서 어떤 플레이를 할지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이다.
입추(立芻)의 여지없이 들어선 동대문 운동장에서 열린 경기는 산토스의 일방적 공세로 시작됐다. 한국대표팀은 예술의 경지에 이른듯한 개인기의 브라질 선수들에 잔뜩 주눅이 들었다. 관중들도 대표팀의 선전보다는 펠레가 어떤 묘기를 보일지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있었다.
전반 43분 알신도가 첫 골을 올리고 집중마크에 시달리던 펠레가 마침내 후반 13분 전광석화같은 오른발 슛으로 추가골을 성공시켰다. 관중들은 마치 우리 팀이 골을 넣은 듯 열광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도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정신적 중압감이 덜어지자 움직임이 달라졌다. 지금은 멘탈이 형편없지만 그 시절엔 한국의 투지(鬪志)가 장난이 아니었다.
후반 17분과 19분 고재욱과 박이천의 결정적인 슛이 아깝게 빗나갔지만 대표팀의 공세에 관중들도 흥분하기 시작했다. 후반 24분, 마침내 차범근이 일을 냈다. 교체 투입된 김진국의 패스를 받아 골에리어 오른쪽에서 강슛을 성공시킨 것이다.
펠레의 산토스를 상대로 골을 넣다니. 관중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며 환호했다. 기세가 살아난 한국은 불과 2분뒤 동점골을 뽑아 운동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주인공은 ‘나의 영웅’ 이회택이었다. 차범근의 패스를 받은 이회택이 단독 드리블로 문전을 치고 들어가 수비수들을 따돌린 후 골키퍼와 1대 1로 맞선 상태에서 통렬한 한방을 꽂아 넣은 것이다.
비록 종료 4분전 산토스의 레오에게 결승골을 허용해 2-3으로 분패했지만 축구의 변방 한국이 펠레가 버틴 세계 최강의 브라질 클럽을 상대로 막상막하의 경기를 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젊은 시절의 이회택 <사진 KFATV 캡처>
이회택은 168cm의 단구(短軀)였지만 그전까지 그라운드를 누빈 선배스타들과는 한 차원 다른 수준의 스트라이커였다. 만약 한국 축구의 세계화가 조금 일찍 됐더라면 전성기에 유럽으로 건너가 차범근 못지 않게 활약을 할만한 천부적인 기량을 갖추고 있었다.
그렇게 이회택을 가슴에 담아둔 나는 인연이 안닿아 축구선수는 되지 못했지만 대신 축구기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삼고 80년대 후반 스포츠신문에 입사할 수 있었다. 수습기자 시절 첫 취재를 안양 축구장에 선배와 함께 갔다. 포항제철과 유공의 경기였는데 공교롭게 포철 감독이 바로 이회택이었다.
경기가 끝나고 포철 선수단이 있는 호텔 숙소에 갔다. 커피숍에서 이회택감독과 수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기분이 묘했다. 어린 시절 우상을 기자로 만났으니 말이다. 만감이 교차했지만 차마 “어릴 적 우상이 당신이었습니다”라는 얘기는 쑥스러워 하지 못했다.
악수할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회택 감독의 손이 여자처럼 너무 고왔다는 것이다. 그라운드를 질주하는 그가 골을 터뜨리는 모습은 호랑이가 포효하는 것 같았다. 그라운드 밖에서도 개성강한 성격으로 방랑자와도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회택, 거칠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상남자’ 이회택의 손이 여리여리한 섬섬옥수로 느껴진 것은 정말 의외였다.
생각해보니 축구선수는 발만 쓰는 운동이니 손이야 거칠어질 이유가 없었다. 정작 인상적인 것은 이회택 감독의 말이었다. 지금도 귀에 생생하다. 내 명함을 받아들고, “노형. 내가 왜 축구선수가 됐는지 알아요?” 무슨 소린가 싶어 눈만 껌뻑껌뻑 했더니, 한숨섞인 미소를 지으며 “내가 어릴때는 전부 축구만 했거든. 아마 지금처럼 야구가 인기있었다면 난 야구선수 했을거야”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당시 프로야구의 인기에 눌린 프로축구의 안타까운 현실을 그렇게 얘기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축구는 ‘국민스포츠’였기에 당연히 축구선수가 됐을뿐 축구선수가 되려고 목표를 세운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문득 그가 축구 아닌 야구를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았다. 축구에 천부적 재질이 있었으니 다른 스포츠도 잘 했을 것이다. 다만 손이 작은 편이라 투수보다는 타자로 성공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축구처럼 야구에서도 최고가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회택 감독과의 오래전 에피소드를 떠올리게 된 것은 호주오픈에서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정 현 때문이다. 4강에서 테니스황제 로저 페더러를 맞아 비록 발바닥 부상으로 기권하고 말았지만 열악(劣惡)한 한국의 테니스 환경에서 여기까지 오른 것이 어디인가.
10여년전부터 세계 수준과 너무나 큰 격차가 있던 스포츠에서도 스타들이 나오고 있다. 수영의 박태환과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마침내 테니스에서 정 현이라는 걸출(傑出)한 유망주가 탄생했다.
스포츠기자를 하던 1980~90년대만해도 우리는 수영과 피겨스케이팅, 테니스, 골프 등에서 세계적 스타들을 절대로 배출할 수 없었다. 첫째는 해당 스포츠의 저변이 약해 선수층이 절대 부족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때부터 재능있는 유망주들은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인기스포츠로 몰렸다. 80년대까지 ‘헝그리 스포츠’로 불린 복싱에서 많은 세계챔피언들을 배출한 것도 시대적 환경 덕분이다.
둘째는 수영, 스케이팅 등은 워낙 인프라가 부족해 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훈련할 수 없기때문이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국내외에서 꾸준히 훈련할 수 있도록 기업의 지원이나 가정의 유복함이 없다면 선수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국력이 커지고 국민소득의 중가와 스폰서기업들의 지원을 받은 덕분에 이들은 숨겨진 재능을 꽃피울 수 있었다.
이회택감독이 어린 시절 인기스포츠 축구를 하다 선수로 대성하였듯이 80년대 프로야구 붐에 힘입어 박찬호 김병헌 서재응 등 메이저리그 스타들이 나왔고, 여자골프의 박세리 덕분에 오늘날 LPGA를 주름잡는 한국스타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아직도 이들 스포츠의 환경은 열악하지만 박태환과 김연아, 정 현의 성공사례들로 더 많은 팀이 만들어지고 후원 기업과 어린 꿈나무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회택이 펠레 앞에서 당당하게 골을 터뜨린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모든 스포츠에 골고루 퍼져 깜짝스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기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새해엔 가져본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로빈의 스포테인먼트’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cro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