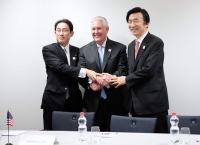베이브 루스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뉴스로=로빈 칼럼니스트 newsroh@gmail.com

야구가 ‘국민오락(National Pastime)’으로 불리는 미국에서 뉴욕 양키스의 존재감은 특별하다. 월드시리즈 우승 총 27회, 2위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11회와 비교하면 얼마나 양키스의 성적이 대단한지 짐작할 만하다.
명문구단답게 많은 불멸(不滅)의 스타들을 배출했다. 영원한 홈런타자 베이브 루스(Babe Ruth)를 비롯, 조 디마지오, 루 게릭, 미키 맨틀, 요기 베라, 레지 잭슨, 돈 매팅리, 마리아노 리베라, 데릭 지터, 앤디 페티트, 버니 윌리엄스 등 영구결번 처리된 스타들이 무려 21명이나 된다. (1997년 전 구단이 공동으로 영구결번 처리한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거 재키 로빈슨을 제외한 숫자다.)

양키스는 1901년 볼티모어를 연고지(緣故地)로 볼티모어 오리올스라는 이름으로 창단되었다. 지금의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세인트루이스 브라운스가 1954년 연고지를 옮기면서 채택한 이름이다. 양키스는 창단 이듬해인 1902년 아메리칸 리그에도 뉴욕에 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연고지를 뉴욕으로 옮겼고, 이름을 하이랜더스로 했다가 1913년부터 지금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북부사람들’이라는 뜻의 양키스는 당시 뉴욕프레스 기자가 작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초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설명회 행사로 오랜만에 양키스 구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외신기자들을 특별히 초청한 행사였는데 그간 양키스에 한국선수가 없다보니 구장을 찾은지 벌써 몇 년이 흘러버렸다.

사실 양키 스타디움(Yankee Stadium)을 덜 찾게 된 또다른 이유는 2009년 옛 구장을 철거(撤去)하고 지금의 구장으로 새롭게 꾸며놓은 뒤였다. 양키스의 역사는 메이저리그의 역사나 다름없고 옛 구장 또한 역사의 생생한 현장인데 이것을 철거하는게 이해가 안갔다.
물론 1923년 지어져 90년 가까운 세월로 워낙 노후화(老朽化)돼 안전상의 이유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었다.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느니 차라리 새로 짓는게 낫다는 판단이었는데, 맞은편에 새 구장을 지으면서 이걸 굳이 허물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옛 구장 자리에 경제적 논리로 다른 빌딩을 짓는다면 몰라도 ‘헤리티지 필드’라는 간이구장으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이해가 안갔다. 구 양키 스타디움의 외형을 그대로 둔 채 내부 시설은 박물관으로, 그라운드 또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말이다. 철거하면서 잔해 중 관중석 의자, 그라운드 흙, 벽돌 등 기념이 될만한 것들을 팬들에게 팔았는데 그로인한 수익보다 관광코스로 활용했다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속적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지 않았을까.
사실 바로 직전 해 뉴욕 메츠가 셰이 스타디움(Shea Stadium)을 허물고 새 구장을 지을때도 고개가 갸우뚱했다. 양키 스타디움은 나이라도 많이 먹었지만 셰이 스타디움은 1961년 지어져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편이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철거하여 스폰서(시티뱅크) 이름을 부쳐 시티필드라는 새 구장을 만들었으니 말이다.
미국은 역사가 짧기에 관련 기록물들을 열심히 잘 모으고 보존하는 나라인데 왜 그랬을까. 특히나 야구는 미국에서 탄생한 스포츠이고 국민의 절반이 좋아하고 미국야구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전통의 양키스의 구장을 말이다. 외국인인 나도 아쉬운데 미국인들이 그런 마음이 없을 리 없다.

그런 감회로 양키스 새 구장을 방문했지만 솔직히 정감(情感)은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처음 양키스 구장을 가본 것은 1991년 여름이다. 당시 스포츠서울의 축구기자였던 나는 한국기자로는 처음 ‘남미 월드컵’으로 불린 코파 아메리카 취재차 칠레에 갔었다. 칠레행 비행기를 미국에서 갈아타야 했는데 경유지를 일부러 뉴욕을 잡았다. 뉴욕에 친구도 있었거니와 양키스구장을 한번 가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축구와 야구가 각각 종교와도 같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남미와 북미에서 경기를 감상했을때의 강렬한 인상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축구와 야구의 장점과 특징을 아주 극대화해서 느꼈다고 할까. 두 개의 스포츠는 너무나 개성이 달랐고 절대 공존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그 해 양키스 구장을 방문하고 기념품 숍에서 양키스라는 로고가 새겨진 아이 점퍼도 샀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나 뉴욕에서 살게 되면서 양키스 구장은 87번 도로를 타고 일주일에 한번은 지나치게 되는 친근한 대상이었다. 밤에 차를 타고 지날때면 구장 외관엔 조명속에 푸른 빛의 양키 스타디움이란 글자가 빛나고 월드시리즈 우승연도들이 훈장처럼 내걸린 곳이기도 했다
옛 양키 스타디움은 토머스 에디슨이 발명한 사상 최초의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의미도 있었다. 처음엔 7만여 명을 수용을 할만큼 야구장으로선 아주 규모가 컸는데 1970년대에 리모델링을 거쳐 5만 명대로 줄었다. 베이브 루스의 홈런이 더 많이 터지도록 우측 펜스가 좌측펜스보다 조금 가까운데 이러한 전통이 새 양키 스타디움에도 이어졌다고 한다. 베이브 루스는 없어도 좌타자 친화구장의 전통은 남은 셈이다.

옛 양키스 구장은 일명 "루스가 지은 집(The House That Ruth Built)"이라고 하는데, 사실 틀린 말이 아닌게 최고의 인기스타인 루스의 홈런 덕분에 엄청나게 관중들이 몰려 그 수입으로 지었기 때문이다. 반면 새 구장은 양키스의 열혈 구단주 조지 스타인브레너 시절 지었다고 해서 "조지가 지은 집(The House that George Built)"이라고도 하는데 그는 양키스의 전력강화를 위해선 돈이든 뭐든 물불을 안가리는 성격이어서 골수팬들에겐 엄청 사랑을 받았다.

새 양키 스타디움의 정문인 4번 게이트는 옛 양키 스타디움의 것을 그대로 본땄고, 4번 게이트와 6번 게이트 사이에 내부 커다란 홀을 그레이트 홀(Great Hall)이라 부르고 있다.
새 양키 스타디움의 총 공사비는 무려 15억 달러. 재미있는 것은 양키스가 부지를 제공한 뉴욕시와 40년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연간 임대료가 고작 10달러라는 사실이다. 사실상 공짜로 형식적인 금액인 셈이다.
뉴욕시야 양키스를 통해 구장 하나 공짜로 지은 셈이고 막대한 세금을 벌어들이니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다. 양키스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구장을 세웠지만 역사적인 옛 구장 자리와 마주한채 있으니 섭섭함이 덜하고 좋은 환경에서 선수들이 뛰고 그만큼 비싼 입장료도 챙기니 누이좋고 매부좋은 셈이다.
* 글로벌웹진 뉴스로 칼럼 ‘로빈의 스포테인먼트’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crobin
- |
- DSC_0873.jpg (File Size:186.3KB/Download:69)
- DSC_0837.jpg (File Size:181.3KB/Download:76)
- DSC_0843.jpg (File Size:144.4KB/Download:62)
- DSC_0853.jpg (File Size:167.9KB/Download:70)
- DSC_0872.jpg (File Size:191.6KB/Download:62)
- DSC_0879.jpg (File Size:136.1KB/Download:73)
- DSC_0902.jpg (File Size:150.1KB/Download:66)
- DSC_0869.jpg (File Size:192.2KB/Download: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