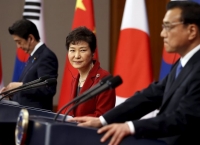며칠 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막 건너온 자전거 여행자 두 분을 만났다. 이 분들은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우즈베키스탄의 히바, 부하라, 사마르칸드,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침켄트를 경유하여 알마티에 왔다. 자전거로 세계 일주하는 의지의 젊은 친구들이었다. 이 친구들은 다른 어떤 중앙아시아 나라보다 우즈베키스탄 여행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어느 마을에나 들어가면 반드시 한국 말하는 현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에 한국에서 이주노동을 했다. 이들의 한국 말은 유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한국 사람을 만난다고 온갖 정성으로 대접을 한다.
일단 숙소는 무조건 자기 집이나 친척 집으로 데리고 간다. 그리고 저녁에는 양고기 샤슬릭과 보드카를 접대한다. 물론 우즈베키스탄의 당도 높은 과일이나 견과류는 기본이다. 술자리에는 동네 친구들과 친척들도 같이 모인다. 통역은 한국서 일한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맡고 온갖 질문들이 쏟아진다. 가장 관심이 높은 질문은 어떻게 한국에 갈 수 있냐라는 실질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풍성한 아침식사를 대접하고 다음 목적지의 친구 연락처를 준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게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무조건 베푼다는 것이다.
자전거 여행자들은 거주등록 문제 때문에 호텔에 며칠 잔거 말고는 거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사람들 집에서 잤다고 한다. 저녁에는 간혹 한국 드라마도 같이 보고 주몽과 대장금, 이민호 이야기를 해주어야 했다. 가끔은 한국 노래도 불러야 했다. ‘사랑을 할거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등 발라드가 인기라고 한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이들의 이야기와 노래를 들으면서 한국으로 가는 꿈을 꾸었을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체류자는 약 4-5만 명으로 추산된다. 약 2만 명은 주로 이주동자인데 이들은 보통 한국에 2-3년 정도 일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귀국한다. 1996년부터 시작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의 한국에서 이주노동은 20년이나 흘렀다. 그동안 한국 땅을 밟고 땀을 흘리며 일한 노동자들은 약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가운데 악덕 사장을 만나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다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이주노동에 크게 만족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한국보다 러시아에 더 많이 이주노동을 한다. 한국은 연간 퀘타가 5천 명으로 제한되지만 러시아는 개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건너가서 불법노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러시아로의 이주노동을 공식적으로 허가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지원도 없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러시아로 간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 구타, 인종차별을 심하게 받는다. 반면 한국에서는 양국 정부가 관여하고 우리나라 사장님들 또한 상대적으로 인간적이다보니 문제될만한 일은 잘 생기지 않는다. 한국 사장님들도 힘 세고 말 잘 듣고 술 안 먹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을 선호한다.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선호 1순위이다.
보통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어 시험을 보아야 한다. 1년에 한번 열리는 한국어 시험은 지방 사람들이 수도 타쉬켄트에 대규모로 집결하는 장날이다. 이 어려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고 보통 3년 정도 한국에 체류하는데 월 천 달러 정도를 모은다고 한다. 귀국할 때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은 대개 3만 달러 정도 돈을 모아서 고향으로 간다.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쉬켄트에서 대졸 취업자들의 월급이 300 달러인 것을 감안한다면 3만 달러의 가치는 엄청나다. 그야말로 한국에 한번 갔다 오면 집안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직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다. 지방사람들이 수도 타쉬켄트에서 와서 놀고먹고 잘 수는 있지만 거주등록과 노동허가증이 안 나오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도 살 수가 없다. 수도가 아닌 지방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유일하게 한국을 통해 세계로 연결된다. 한류 드라마가 밤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한국 자동차, 전자제품을 사용한다. 여기에다 한국에 일하고 온 이주노동자들은 마을의 유지가 되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침 튀기며 자랑을 한다. 우즈베키스탄 관리들의 말에 의하자면 한국 갔다 온 놈들은 다 똑똑해져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한국서 장사하고 비즈니스 하는 것을 배워서 대부분 마을의 부자나 유지가 된다.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의 꿈은 다시 한 번 한국에 가 보는 것이다. 단순한 노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친구도 만나고 싶고 한국서 일 할 때 못가본 제주도나 에버랜드를 방문하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불법체류 문제 때문에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비자를 잘 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서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워겠는가? 그동안 쓰지 못한 한국어도 말하고 한국 소식도 듣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도 되니 얼굴도 처음 보는 한국 손님들이 왔다면 버선발로 마중나가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중환율제로 달러를 사용하면 물가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싸다. 3성급 호텔은 20 달러, 양고기 샤슬릭은 하나에 1달러가 되지 않는다. 현지 볶음밥인 플럽은 1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멜론, 체리, 수박은 아무리 먹어도 돈이 안 나온다. 견과류도 공짜에 가깝다. 교통비도 한국에 비교하면 택시가 거의 버스 가격 수준이다. 100달러만 바꾸어도 풍성하게 쓸 수 있다.
여행자에게 중요한 치안은 완벽하다. 워낙 독재국가이고 경찰국가라서 사소한 범죄 따위는 발을 붙이기 힘들다. 특히 지방에는 마할라라는 공동체가 잘 발달되어 범죄가 거의 없는 편이다. 밤에 안심하고 돌아다녀도 된다. 거기에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큰 호감을 갖고 있어 친절하게 대해준다. 마을마다 이주노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 통역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관광도시인 사마르칸드에 가면 한국어로 가이드 하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기차역이나 버스정류장에 줄서 있다.
실크로드의 진주인 우즈베키스탄은 이국적인 관광지도 풍부하다. 칭기즈 칸이 파괴하고 티무르가 건설한 아름다운 제국 도시였던 사마르칸드, 19세기 최대의 오아시스도시였던 부하라, 숨겨진 비밀도시 히바, 물이 줄어들고 있는 아랄해, 그리고 천산산맥의 마지막 줄기인 침간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친절하고 순박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재수 좋으면 밭매고 있는 김태희도 볼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 여행을 이번 여름에 추천하고 싶다.(윤성학 객원논설위원. 고대교수)








![[뒷북칼럼] “홍콩한인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1)](http://www.okja.org/files/thumbnails/922/020/200x145.crop.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