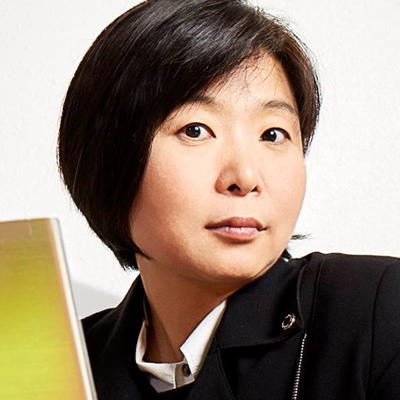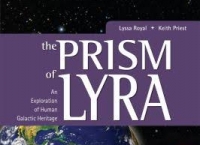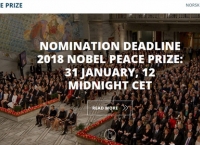#me too, 뉴욕타임스, 그리고 JTBC
[i뉴스넷] 최윤주 발행인 editor@inewsnet.net
생태계의 생리는 잔학무도하다. 몇날 며칠을 굶은 최상위 포식자에게 자비란 없다. 심장이 터질 듯 달려 숨을 곳을 찾아도 소용없다. 작고 여린 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표적이 된다.
인간세상도 마찬가지다. 평화로운 초원처럼 안정적인 관계도 존재하지만, 어떤 인간관계는 저항할 수 없는 최상위 포식자의 먹이사냥처럼 폭력적이고 잔인하다.
2017년 10월,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제작의 권력, 하비 와인스타인이 수십명의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혔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아기 사슴을 덮치는 포악한 포식자의 모습 같았다.
유명 연예인들의 폭로가 수없이 뒤따르자 결국 와인스타인은 자신의 영화사에서 쫓겨났다. 울음소리마저 삼켜야 했던 피식자들이 최상위 포식자를 사냥한 기적이자 혁명이었다.
이후 “나도 당했다(#me too)”는 여성들의 고발은 삽시간에 확산돼 각 분야에서 수백만건에 달하는 성폭력 피해가 폭로되는 반향을 일으켰다.
2018년 1월, #me too 열풍이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가 8년전 자신이 당한 성추행을 폭로하면서 불을 지폈다.
서지현 검사가 주장한 성추행 사건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벌어졌다. 당시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수행하고 온 안태근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서 검사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었으나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누구도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너 하나 병신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어차피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입 다물고 그냥 근무해라.”
“잘 나가는 검사 발목잡는 꽃뱀으로 찍힐 수 있다”
성추행을 당한 후 서검사가 직간접적으로 들었던 위협적인 언어다.
“8년이 지나 폭로하는 게 아니라, 폭로하는 데 8년이나 걸렸다.”
왜 8년 전 일을 이제야 폭로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서검사의 답변이다.
인간세상이나 동물의 세계나, 먹이사슬에서 최상위 포식자는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다. 목숨줄을 쥔 최상위 포식자를 향한 피식자의 저항은 성추행에 버금갈 정도로 끔찍한 공포다.
#me too 운동 확산에 반드시 짚어야 할 존재가 언론이다.
하비 와인스타인 기사가 <뉴욕타임스>에 보도됐을 때 헐리우드 관계자들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사건의 추악함도 대단했지만, 그보다 놀라웠던 건 와인스타인의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뚫고 보도가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와인스타인은 그 바닥에 최상위 포식자였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최상위 포식자는 바람처럼 달려와 지상을 뛰노는 연약한 동물들의 목덜미를 포악스럽게 문다.
본인이 원하지 않은 질문을 한 기자의 면전에 육두문자를 날리고, 해당기자의 남자친구의 목을 죄는 행동을 서슴지 않을 정도였다.
백악관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쓴소리를 뱉어내는 미국의 언론환경에서 기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도 무방한 포식자가 ‘호텔방에서 얘기 좀 하자’며 여배우를 불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은 별로 어렵지 않다.
하비 와이스타인 사건에 <뉴욕타임스>가 있었다면, 대한민국에 부는 #me too 열풍에는 <JTBC 뉴스룸>이 있다.
JTBC는 서검사와의 인터뷰에 18분이 넘는 시간을 할애했다. 다른 신문사들이 입을 다물거나 가십거리로 치부하거나 관성으로 무시했을 때, JTBC는 절제된 선을 품격있게 지켜가며 서검사 고발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폭로에 진실의 힘을 실어줬다.
#me too 열풍의 이면에는 언론이라는 포식자의 침묵이 원죄처럼 자리한다.
언론의 침묵은 포식자를 배부르게 하는 동시에 피식자의 신음으로 돌아온다. 추악한 포식자가 자신의 추행을 수십년동안 가릴 수 있었던 데는 언론의 침묵이 있었기 때문이다.
언론의 침묵은 범죄행위다. 전 세계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민주국가가 언론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은 부조리에 대한 항거와 기득권에 대한 비판과 권력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다.
세상의 모든 언론이 바로 서야 하는 이유다.
Copyright ⓒ i뉴스넷 http://inewsnet.net